엔비디아, CES에서 로보택시·베라 루빈 공개…자율주행 경쟁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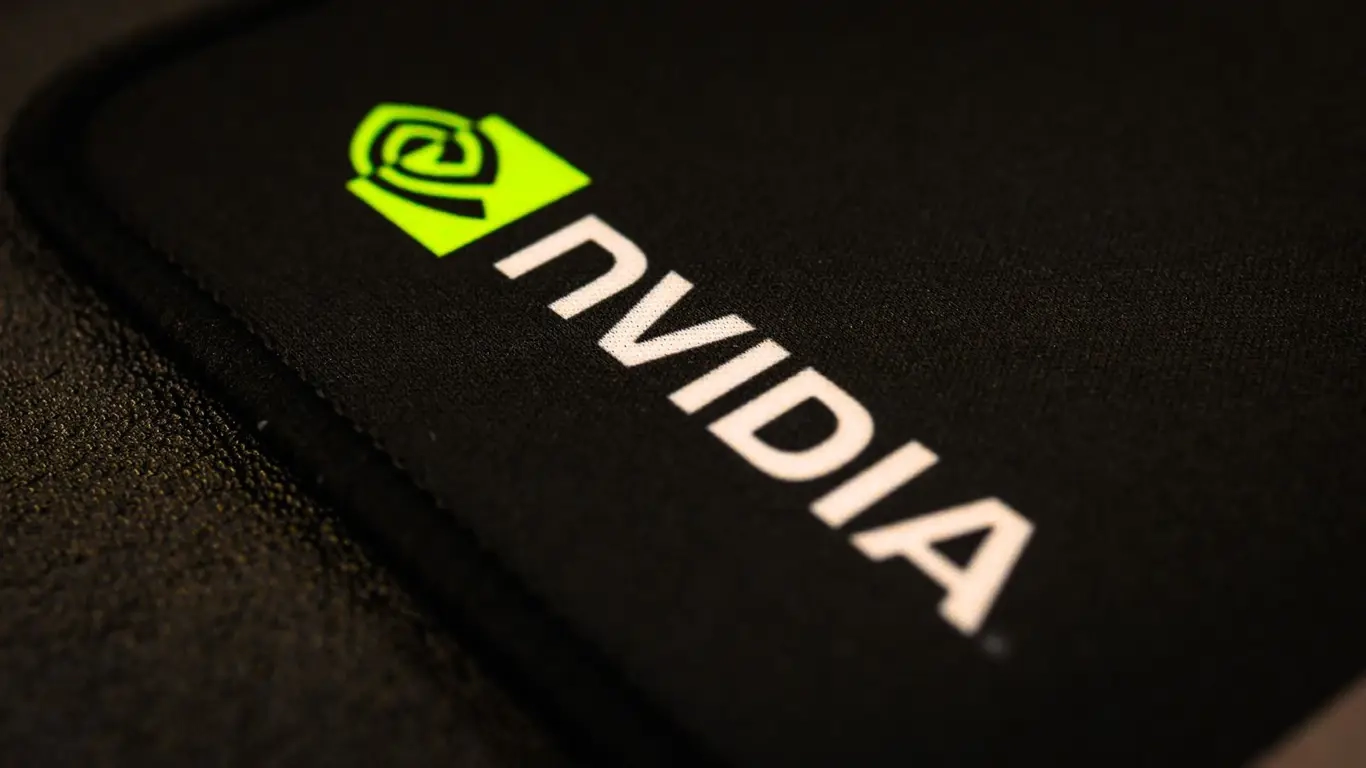

CES에서 엔비디아가 2027 로보택시 계획과 차세대 베라 루빈 칩을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CLA 자율주행 데모, 카메라·레이더·라이다 센서 융합, 웨이모·우버 경쟁까지 핵심 정리. 주크스 동향과 차량 내 컴퓨팅 파워의 의미도 짚었습니다. 카메라 단일 접근과의 차이도 짚어봅니다.
최근 몇 년간 AI 붐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른 엔비디아가 그 영향력을 자동차로 선명하게 돌리고 있다.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파트너와 함께 이르면 2027년에 선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계획은 그 이후까지 이어진다. 2028~2030년 사이에는 자율주행 솔루션을 여러 브랜드의 일반 소비자용 차량에 탑재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은 대담하지만 업계 흐름을 보면 무리한 도박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상징적인 시연은 메르세데스-벤츠와 맞물렸다. 쇼 개막 전날, 신형 CLA가 샌프란시스코 도심 구간을 주행하며 표지판과 신호등, 우선통행 규정, 보행자를 식별해냈다. 다만 더 긴 구간에서는 안전요원이 개입해야 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도시는 자율주행에게 가장 험한 무대임을 다시 상기시킨다. 현장감 있는 데모로, ‘가능성’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어디에 있는지 꽤 명확해졌다.
엔비디아가 택한 길은 단일 센서가 아니라 조합이다.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는 선명한 화면만으로는 부족하고, 변칙 상황에 대한 내성이 관건이다. 인도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과 곧 차도로 발을 들이밀 사람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CLA 데모에서는 카메라 10개와 레이더 5개가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보택시 영역에선 주변 지형을 신뢰도 있게 읽어내는 라이다의 역할도 강조한다. 이런 흐름을 놓고 보면, 카메라만으로 가겠다는 테슬라의 철학은 업계 전체 속에서 점점 고립된 선택처럼 비친다. 센서 융합이 현재로선 가장 실용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로보택시를 둘러싼 경쟁도 CES의 화두였다. 우버는 루시드 기반의 향후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개하며 샌프란시스코 일대 투입 계획을 내놨고, 아마존의 주크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을 이미 시험 중이다. 규모 면에서는 웨이모가 여전히 선두로 평가되며, 미국 여러 도시에서 수천 대의 무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주도권 싸움은 연구실이 아니라 실제 도로에서 판가름 나는 분위기다.
한편, 엔비디아는 CES에서 차세대 칩 역시 공개했다. 이전 세대 블랙웰 대비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한 ‘베라 루빈’ 플랫폼의 양산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량 내부의 연산 능력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이 행보의 의미는 더욱 크다. 차 안의 컴퓨팅 파워가 곧 주행 완성도를 좌우한다는 등식은 이제 부정하기 어렵다.